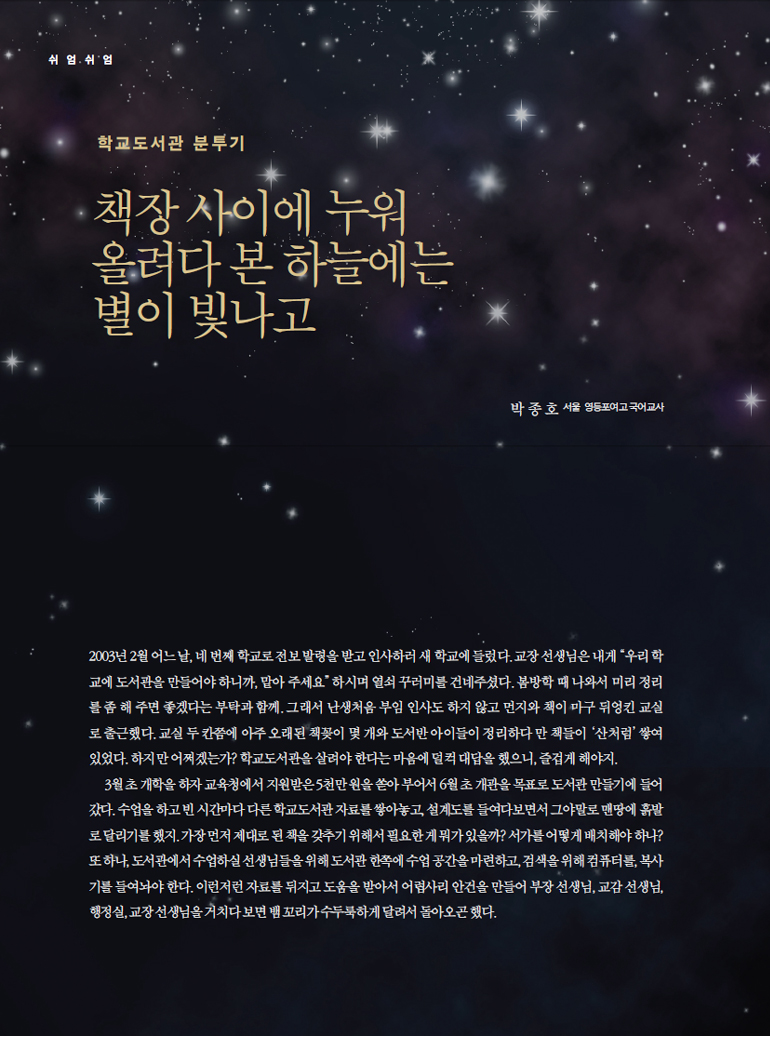칼럼 학교도서관 분투기 - 책장 사이에 누워 올려다 본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주말도 없이 매달려서 도서관 겉모습은 갖추었다. 새로 서가를 들이고 나서 도서 목록을 새로 만들어 입력하고 서가에 꽂는 일을 제대로 하기에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다. 생각 끝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람을 구해 쓰라고 하셨다.마침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가 있어 도움을 청했고, 그 녀석 힘을 빌려 두 달 동안 밤낮으로 책을 꽂고 입력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행정실에서 시간제 근무 사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저녁 늦도록 책을 찾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라 오후 1시부터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구했다고 했다. 그렇게 오신 사서 선생님은 학교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했는지 도무지 도서관에 정을 붙이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어서 도서관을 개관하고, 사서 선생님과 협력하여 선생님과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은데 한참 엇나간 셈이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은 사서 선생님대로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만 가득 안은 채 그만두고 말았다. 개관일은 다가오고, 나는 제자 녀석과 밤샘을 하면서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 모습을 갖춰 나갔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도서관은 문을 열었다. 개관식을 마치고 제자와 서로 고생을 위로하며 한잔하고는, 늦은 밤 다시 도서관으로 갔다. 서가 사이에 누워 바깥을 보니, 아! 유월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 별빛에 보태어 내 눈물도 반짝였을 터.
그렇게 도서관 담당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일곱 해를 맞는다. 두 해는 다른 선생님이 맡았지만, 그래도 나는 ‘도서관장님’ 자리를 내려놓은 적은 없다. ‘학교에서 도서관은 종합정보센터이고,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의 지식 정보화를 이끄는 공간이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솔직히 나는 그런 근사한 말 따위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 있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즐겁게 뛰어노는 마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도 도서관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하지만, 마음 둘 데 없는 아이가 빈 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어 서가 한 귀퉁이에서 책 속으로 스며들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오늘도 어떤 책을 들여 놓아야 하는지, 아이들이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를 눈 크게 뜨고 고민하며 살고 있다. 아이들이 읽다가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 책, 그런 책으로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게임하는 녀석들, 만화책만 뒤적이는 녀석들, 도서관을 오로지 과제물을 출력하고 복사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녀석들과 벌이는 실랑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갈수록 도서관이 흔들리고 있다.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말고, 책을 붙잡고 혼자서 빠져드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든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바깥의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정말 학교도서관은 그 바람에 휩쓸려 7년 전 먼지 가득한 빈 교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걱정이다, 걱정…….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행정실에서 시간제 근무 사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저녁 늦도록 책을 찾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라 오후 1시부터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구했다고 했다. 그렇게 오신 사서 선생님은 학교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했는지 도무지 도서관에 정을 붙이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어서 도서관을 개관하고, 사서 선생님과 협력하여 선생님과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은데 한참 엇나간 셈이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은 사서 선생님대로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만 가득 안은 채 그만두고 말았다. 개관일은 다가오고, 나는 제자 녀석과 밤샘을 하면서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 모습을 갖춰 나갔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도서관은 문을 열었다. 개관식을 마치고 제자와 서로 고생을 위로하며 한잔하고는, 늦은 밤 다시 도서관으로 갔다. 서가 사이에 누워 바깥을 보니, 아! 유월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 별빛에 보태어 내 눈물도 반짝였을 터.
그렇게 도서관 담당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일곱 해를 맞는다. 두 해는 다른 선생님이 맡았지만, 그래도 나는 ‘도서관장님’ 자리를 내려놓은 적은 없다. ‘학교에서 도서관은 종합정보센터이고,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의 지식 정보화를 이끄는 공간이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솔직히 나는 그런 근사한 말 따위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 있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즐겁게 뛰어노는 마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도 도서관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하지만, 마음 둘 데 없는 아이가 빈 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어 서가 한 귀퉁이에서 책 속으로 스며들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오늘도 어떤 책을 들여 놓아야 하는지, 아이들이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를 눈 크게 뜨고 고민하며 살고 있다. 아이들이 읽다가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 책, 그런 책으로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게임하는 녀석들, 만화책만 뒤적이는 녀석들, 도서관을 오로지 과제물을 출력하고 복사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녀석들과 벌이는 실랑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갈수록 도서관이 흔들리고 있다.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말고, 책을 붙잡고 혼자서 빠져드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든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바깥의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정말 학교도서관은 그 바람에 휩쓸려 7년 전 먼지 가득한 빈 교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걱정이다, 걱정…….